
친구야. 파도와 같이 굽이쳐오는 외로움이 있었다만 반딧불이 춤을 추는 밤하늘에 네 얼굴의 조각달을 빚어놓고 밤이슬을 자작자작 맞으며 네 모습에 취하여 술처럼 웃어야 했었더구나. 친구야. 숲이듯 바람을 일으키는 기쁨이 있었다만 울고 있는 네 모습이 하도 까마득해 찰박이는 달뜨는 밤바다에 네 얼굴의 쪽배를 띄워놓고 아름아름 노를 저으며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저 물새이듯 나 또한 그렇게 울어야 했었더구나. 누그든 슬픔과 기쁨이 있으면 거짓 없이 안아주는 우리의 하늘이 있으니 언제고 보고프면 하늘을 보며 소리쳐 이름을 부르자꾸나. 너는 나를 나는 너를.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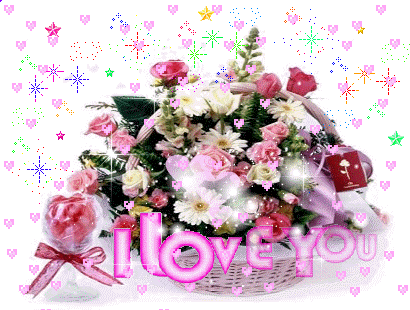 |
'♣ 친구방 ♣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어느날의 커피 (0) | 2010.04.13 |
|---|---|
| 현충원엘 다녀 와서 ..!! (0) | 2010.04.12 |
| 베푸는것이 이기는 길 (0) | 2010.04.08 |
| 돌아가는 길 (0) | 2010.04.05 |
| 허브의 종류와 사용법 ..^^ (0) | 2010.04.03 |